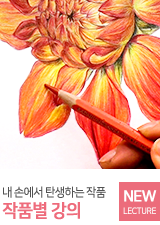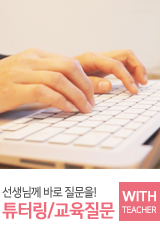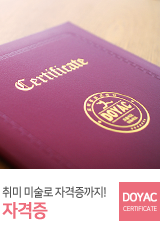아주 기초적인 질문인것 같은데요
육면체에서 빛이 앞,위 45도에서 비춘다고 가정했을때 가장 어두운 면과 가장 밝은 면은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강의할때 중간면을 밝은 면으로 정하고 공기원근법을 적용했는데 이게 절대적인지? 아니면 중간면을 어두운면으로 생각하고 공기 원근법에 의해 시점에서 가까운쪽이 더 어둡게 표현해도 되는지?
아니면 말그대로 밝음도 어두움도 아닌 중간이서 한톤으로만 표현하고 공기원근법을 적용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어떤 변수 때문 일까요???
계속 머리속에서 의문이 맴돌아서 질문해 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정해민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 빛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통 석고 기하도형을 처음 다룹니다. 특히 육면체의 경우는 밝음과 중간, 어두움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다루는 석고 기하도형의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석고 기하도형은 당연히 “석고”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석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석고의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하도형의 석고 표면에는 어떤 색이 입혀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유리나 스테인레스, 벽돌 등의 특정 질감과는 다른 석고 고유의 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고 고유의 질감은 유리처럼 투과되는 것과 다르고 거울이나 스테인레스처럼 반사되는 정도가 심하지 않고 벽돌처럼 질감이 거칠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감이 보편적, 또는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색이나 문양이 없기 때문에 구조에 따른 톤을 공부하기에 좋습니다. 여기서 구조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밝은 면과 중간면, 어두운 면은 면의 빛에대한 면의 각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석고는 색과 문양이 없고 질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석고 고유의 질감과 색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기본적이기에 편의상 없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색이 들어간다면 원근에 따른 색상과 채도를 고려해야 하고 질감 역시 그러합니다. 그런데 석고는 구조에 따른 명도만 구분하면 되기 때문에 구조를 파악하고 원근법을 익히기에 좋습니다.
구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도가 다른 면들이 만나서 생기는 어떤 것입니다. 육면체의 경우 위쪽, 45도 앞 쪽에서 빛을 설정 했을 때 3면이 밝음, 중간, 어두운 면으로 잘 구분 됩니다. 이 때 밝음과 중간을 뭉뚱그려 “밝음”으로 보고 크게 “밝음”과 “어두운 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면을 어두움으로 생각하신다면 그 것은 더 이상 중간면(밝은면)이 아니라 어두운 면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면은 원근에 따라 시점에서 가까울수록 더 어둡습니다. 단순히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질감과 색감이 0(zero)인 상황에서 중간면은 밝은면 중 하나이며 그 중간면이 시점에 가까울수록 어두워 진다면 그 면은 더 이상 중간면(밝은면)이 아닙니다. 어두운 면이 된 것이며 광원 위치에 따라 어두운 면이 2면, 또는 3면 모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카리 스웨트 캔만 하더라도 이 법칙이 깨지는 것 같이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밝은면에서 하이라이트 (지우게로 지워내거나 처음부터 연필을 대지 않아서 종이 자체로 남겨놓은 가장 밝은 면) 정도는 밝게 처리되어 밝은 면이라고 이해되는데 같은 밝은면(중간면 포함)임에도, 파란 몸통 부분 중 빛을 받는 부분임에도 어둡게 처리되어 원근법이 깨진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원기둥이라는 구조는 (석고) 기하도형과 같지만 질감과 색감이 0 (zero)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밝은면에 하이라이트가 날카롭게 생기는 것은 알루미늄의 반사 정도가 석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란 색감의 밝은면을 부분적으로 어둡게 처리한 것은 파란색의 채도를 해석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포카리 스웨트의 고유색인 파란 색감의 채도를 소묘로 표현할 때 파란 색을 칠할 수 없음으로 그 색깔의 채도를 명도로만 표현 합니다.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수월한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까만 머리에 피부가 하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까만 머리의 밝은 면의 명도와 피부의 어두운 면의 명도 중 어떤 것이 더 어두울까요? 물론 머리의 밝은면이 더 어둡습니다. 까만 머리의 밝은면은 구조로 봤을 때 빛을 받는 면이지만 머리 고유의 명도 자체가 워낙 어두워서 밝은면임에도 불구하고 어둡습니다. 포카리 스웨트의 파란 색의 명도를 어둡다고 파악한다면 (이 것은 어느 정도 상대적 입니다. 포카리 스웨트 보다 더 어두운 명도의 물체가 같이 있다면 포카리의 파란 색의 명도를 밝은 명도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밝은면임에도 그 고유 명도가 어둡기 때문에 (마치 까만 머리처럼) 시점에서 가까운 파란 부분을 더 어둡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포카리스웨트 캔을 그리더라도 그리는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 합니다. 제가 초급에서 다룬 캔은 일정 부분은 파란 색의 명도를 어둡게 파악하고 또 일정 부분은 마치 석고의 원기둥처럼 밝게 파악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유는 기하도형 원기둥을 다룬 것과 연계하는 것과 함께 포카리의 고유의 질감과 톤을 소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동영상 강의 때 이 것을 다 풀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 같아 적정 수준의 설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seesaw님 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글로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배운다는 것의 특성상 이론과 함께 직접 그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이론을 습득하고 타는 것이 아니라 일단 타면서 익히는 것처럼 그림 역시 이론과 원리를 온전히 익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익혀지는 부분이 생기며 원리 역시 깨우쳐 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혹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차분하게 그림을 계속 그려 나가시다보면 이해되는 시점이 옵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
너무도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묘와 색 까지도 넓게 설명해주시니 더 이해의 폭을 확장할수 있네요,
빛은 기본적이면서 영적인 차원까지 도달할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내용]--------------------------------------------
도움이 되셨다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