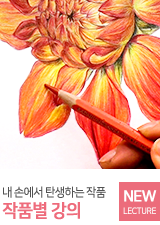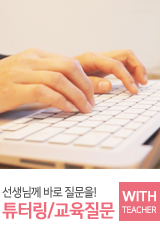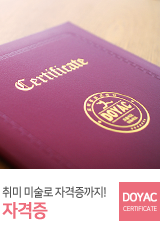오늘도 덥습니다 ㅠ.ㅠ 선생님께서 계신 곳은..수업때 들어서 산골짜기에 본가가 계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고라니 고라니..)
조금 시원하시지않을까..라고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가지 고민과 의문을 정리하려고 했으나 그것은 다음글으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그리던 그림이 있어서 (만화는 아니고 더워서 일러스트를 한 장 그려보려고 ...여름 분위기로요;ㅅ;
튜터링을 이걸로 대신합니다.
아! 그전에 바로 전 질문에 답해주신 글을 보고 의문이 든 점에 다시 여쭙습니다.
1.
저라면 성벽 부분에 전체적으로 벽돌의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 붙였던 톤을 모두 제거하고
나무와 하늘에 색상용 스크린 톤을 붙여주고 성벽엔 명암으로만 톤을 붙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명암으로만 톤을 붙인다는 게 무슨 뜻이죠? ㅠ.ㅠ 명암톤? 이라고 따로 있나요?
2. 사진 LT변환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ㅅ;
왜 그러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쓴 사진이야 연습용이라서 구글링 한 거긴 하지만..
직접 찍은 사진이라면 변환하는 것이 시간이 절약되지 않나요?
물론 일일이 다 그리는 걸 저도 좋아하는데요.. 선생님처럼 프로분들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라도 이런 기능을
더 많이 활용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의 대답에 깜짝 놀랐답니다.ㄷㄷ
3. 배경질문의 PX에 관해 여쭤본 것은 펜선 굵기에 대해 여쭤본거랍니다;ㅅ; DPI에 대한 답변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펜 선 굵기는 보통 배경그을 때랑
인물 그을 때 몇 픽셀 정도로 그리시는 지 궁금해서요;ㅂ;
그리고 첨부한 파일은 일러스트 러프입니다.
1. 그런데 이런 일러스트를 그릴 때 소실점이 늘 고민되는데요,
보통 인물을 어디쯤 배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소실점을 정하시는지 아니면 소실점 을 정하고 구도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지금 제가 정해놓은 소실점에 그림이 잘 맞아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ㅠㅠ..분명 원근법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릴 때마다 머리를 쥐어뜯네요 ㅠ.ㅠ
선생님은 원근법을 어떻게 공부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ㅠ.ㅠㅎㅎ
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시원한 하루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정말 덥습니다.
낮에 더울 때 자고 밤에 선선할 때 일하는데(선선하지 않죠..)
정말 죽을 맛입니다. 컨디션도 최악이고 이럴 때 마다 시베리아로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8월 행사를 위해서 죽어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에 답을 해볼까요.
1번질문:
아무래도 텍스트 설명으로만으론 부족한 듯 싶어 첨부 그림 같이 올려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론부터
우리가 흑백만화에서 톤을 붙이는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말 그대로 빛이 닿지 않아 생겨나는 명암(사물의 입체감과 원근감을 돋보이게 해주는 실질적 요소)
와 각기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조를 까만 점으로 그 색조의 농도에 일치 혹은 근접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이유로 인해 스크린 톤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는 점입니다.
아래의 그림 보면서 이해해주세요.

위 처럼 실제의 컬러를 흑백의 단일화된 그림으로 나누었을 때 톤을 붙이는 요령은
톤을 붙이는 이유 두 가지와 똑같이 나눕니다.
색조의 표현과 명암.
그리고 이 둘이 서로 겹쳐지거나 너무 단조로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색조 혹은 명암의 단계를
서로 조금씩 차이(명도의 차이)를 두어 그림이 눈에 잘 띄도록 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얀 여백과 먹도 적절히 써가며 그림의 명도를 잘 띄게 해주어 독자의 눈에
쏙 들어오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 즉 성벽이 노랗다고 해서 색조의 톤을 붙여 줄 것이 아니라 성벽에 그림자가 지는 부분들만을
톤으로 표현하여 나무와 성벽이 서로 묻히지 않게끔 해줘야 나무는 나무대로 성벽은 성벽대로
서로 눈에 잘 띄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지난번의 성벽 배경에선 나무와 성벽에 모두 비슷한 밀도의 톤을 붙였기 때문에 서로 묻혀버려
그 어떤 것도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2번질문: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제가 가장 질색하는 것이
사진이나 어떠한 3D 자료 등을 리터칭 혹은 자신이 직접 그려내지 않는 것을 그대로
원고에 붙여 넣거나 자주 써먹는 방식입니다.
국내 웹툰 계에서 어시를 고용할 여유가 없거나 배경을 그릴 줄 몰라 "그저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방식은 전 해본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 누구에게도
가르치지 않을 작정입니다.
특히나 그림을 "배우는 단계"에 있는 후배 혹은 학생들에게도 자기 스스로가 자꾸 그리고
고민하고 연구하며 쌓는 경험과 관계없이 그저 누가 "이렇게 하면 편하니 너도 해봐"라는
귀찮음의 단계를 밟는 요령에 관해선 관대해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정말 마감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는 기성작가들이라면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지만 배움의 단계에 있는 분들에겐 절대로 권하지도 않으며 그렇지 않아도
귀찮고 어려운 배경에 대한 게으른 마인드가 꽃피게 되는 현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진 변환하여 원고에 넣을 바엔 다른 연출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좋아하지 않는게 아니라 매우 싫어합니다.
3번질문:
펜의 두께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느 정도라는게 있는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키우고 줄이고
엿장수 맘대로 입니다. 딱히 이점에 대해선 알려드릴 정보가 없습니다.
몇 단위로 쓰는지 체크해 본적도 없네요..신경 써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러스트 러프에 관하여!
1번:
구도를 먼저 떠올려야죠. 어떤 각도를 그리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소실점을 찾게 되는 것이니까요.
한 장의 캔버스에 내가 넣고 싶은 모든 사물의 정보를 충분히 안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구도를
떠올리고 그런 뒤에 가장 효과적인 소실점을 하나 혹은 두 개 정도만 잡아냅니다.
2번:
사실 지금 딱히...우측의 펜스를 제외해선 소실점의 유무를 알아보기가 힘든 형태입니다.
주인공들의 윗쪽 주변에 몰려 있는 나무들의 러프도 원근감을 알아보기 힘들고
좌우에 나란히 서있는 두 명의 인물도 바로 똑같은 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연습 일러스트에선
소실점을 찾아 낼 수 있는 단서를 주는 것은 단 하나 "소실점을 기준으로 그려낸 펜스" 딱 하나 뿐입니다.
이런 경우 두 명의 주인공들을 좌우에 나란히 배치하기 보다 앞 뒤로 배치를 하여 멀리 있고 가깝게 있는
인물로 인해 좀 더 원근감을 쉽사리 나타낼 수 있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배경에만 소실점을 잡았다고
표현하기 보다 인물까지 함께 앞 뒤로 깊이를 표현해주면 원근감을 독자들이 더더욱 쉽게
느낄 수 있는 배치가 됩니다.
배경도 배경이지만 독자들이 보는 건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트릭을 이용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